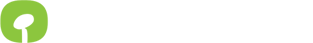자연을 품고 사람을 살리는

9월 중순, 강원도 횡성 공근공동체는 벼 수확을 앞두고 피뽑기가 한창이다. 마을 초입에 위치한 공근초등학교 공명분교 옆 논에서 만난 정종학 생산자는 올해 피 뽑는 작업만 여섯 번째다. 벼보다 위로 한 뼘 정도 솟은 피를 잘라 허리띠에 매단 망태기에 담아내기를 닷새는 반복해야 끝나는 일이다. “ 쌀 수확 전까지는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피를 다 잡아놔야 내년에 고생을 덜하죠.”
피뽑기 외에도 제초제나 살충, 살균제를 뿌리면, 덜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한살림 생산자들은 일 년 내내 이러한 씨름에 익숙하다. 보통 쌀은 10월 추수가 끝난 뒤, ‘내년 피 잡는 법 ’을 고민하는 것부터 미리 다음해 농사 를 시작한다. 물의 높낮이를 조절하거나 우렁이를 넣는 방법도 있지만, 벼를 수확하고 난 뒤 호밀을 심어 풀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도 한다.
봄이 오면 못자리를 준비해 아침, 저녁 물을 주고, 논자리의 흙을 뒤집어엎고 골고루 펴주길 반복하며 논을 삶는다.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모를 심는데, 이 때부터 본격적인 병해충 및 풀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모가 커감에 따라 조금씩 논에 물높이를 높여가며 벼를 키우고, 8월 중순이 되면 잎집에 싸여 있던 이삭이 나와 수정을 한다. 낟알이 맺히고 누렇게 익으며 고개를 숙이면 9월 초부터 조생벼를, 추석 즈음부터 만생 벼를 수확한다.


제초제와 화학비료 없이 농사를 짓다 보니, 메뚜기와 방아깨비, 개구리, 미꾸라지 등 수생 생물들과 고라니나 백로 같은 야생동물들도 자유로이 논을 드나든다. 한살림 논은 뭇 생명들이 함께 나고 자라 다시 흙으로 돌아가길 반복하는 생명 순환의 장이다.
올해도 풍년, 웃지 못하는 생산자들
1985년 한살림에 첫 유정란을 공급하며 한살림운동의 시작을 알렸던 공근공동체는 작년 한 해 74,800kg의 쌀을 냈다.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공동체 24 가구 생산자 대부분이 논농사와 밭농사를 함께 짓는다.
정현모 생산자는 마을에 둘밖에 남지 않은 공근공동체 1세대 생산자 중 한 명이다. 그는 올해 유독 다른 풀들이 많이 올라온 이유가 벌레의 습격을 받은 우렁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해마다 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날씨는 또 어떨지 가늠할 수 없으니, “인간은 미물에 불과하고, 농사는 하늘이 반 짓는”거란 말도 덧붙인다. 공근공동체는 초창기 닭에서 나온 똥오줌으로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하고, 자연에 두루두루 이로운 유기농사를 지어 보겠다는 다짐으로 무작정 친환경 쌀 농사를 시작했다. 손 많이 가는 유기벼 농사에서 부족한 일손은 농활 온 학생들 몫일 때가 많았다. “유기농 벼를 키우니, 처음 보는 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일일이 다 손으로 뽑았지. 여학생들도 그 여린 손으로 어찌나 열심히 풀을 뽑던지. 한살림 실무자들 중에 그 때 왔던 청년들도 더러 있지… 생각하면 지금도 참 고마워.”
벼가 익어 고개 숙인 모습으로 짐작한 것이지만 올해 공근공동체의 쌀 작황은 예년보다 더 좋을 전망이다. 보기 드문 대풍년이란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그런데 생산자들 얼굴은 마냥 밝지만은 않다. ‘내년엔 쌀이 더 쌓이는 것 아닐까…’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한살림 쌀생산자들 중에는 올해 공급한 쌀을 재주문해 쌀소비운동에 동참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벼 재배면적이 사상 처음 80만 헥타르 선으로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를 했고, 지난 7월 정부는 3만 톤의 밥쌀용 쌀 수입을 확정했다. “풍년이어도 기쁘지 않다”는 정현모 생산자의 말이 가슴을 파고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부터 쌀을 주식으 로 먹어왔다. 기후와 풍토가 쌀농사를 짓는데 유리하기도 했지만, ‘밥심’의 위력, 그리고 씹을수록 단맛이 도는 기특한 쌀 맛을 무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쌀은 모든 곡물 중 가장 훌륭한 탄수화물의 공급원이며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소도 풍부하게 들어 있다. 별다른 간식 없이 생활을 잇기 위한 유일한 에너지원이었던 쌀이기에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남자들은 지금의 일곱 배에 달하는 고봉밥을 끼니때마다 먹었다. 사정이 이러니 밥을 지으면 ‘밥알에 윤기가 있고 부드러우며 향긋함’이 일품이라며 밥 잘 짓는 나라로 소문이 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세계 각국에서 건너온 화려한 요리들과 유행에 맞춰 발 빠르게 변화하는 인스턴트 음식들이 난무한 요즘, 밥맛을 따질 새 없이 숨 쉴틈없는 일상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일편 서글픈 마음이 든다.
쌀 한 톨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한살림연합 소식지 2015년 10월 (536호)에 실린 글입니다.
글·사진 문하나 편집부